1세기 교회질서34: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3)(딛 1:5-9)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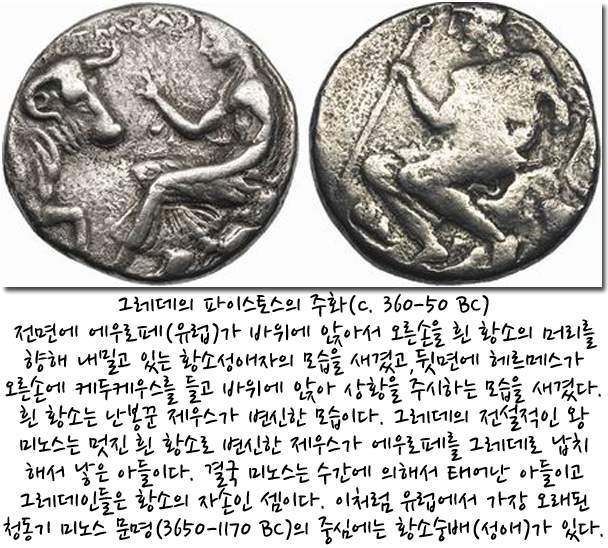 ‘디도’(Titus)라는 이름은 동시대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단장의 이름과 동일한 것에서 보듯이
흔한 라틴어 이름이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단장 티투스는 역시 군단장 출신이었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에 이어서 제10대 로마의 황제에
등극한 인물이다. 재위기간에 아버지가 건축을 시작한 콜로세움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디도’(Titus)라는 이름은 동시대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단장의 이름과 동일한 것에서 보듯이
흔한 라틴어 이름이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단장 티투스는 역시 군단장 출신이었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에 이어서 제10대 로마의 황제에
등극한 인물이다. 재위기간에 아버지가 건축을 시작한 콜로세움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바울은 디도를 헬라인으로 지칭했다(갈 2:3). 바울은 4절에서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일컬었다. 여기서 ‘아들’이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란 의미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바울은 역시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아들”(고전 4:17, 딤전
1:18, 딤후 1:2)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전도해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다(딤후 1:5).
디도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된다. 40년대 후반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였고, 예루살렘교회의 에비온파
유대인들이 안디옥교회에 야기한 율법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후 51년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안디옥교회의 헬라인 그리스도인 디도를 대동하였기 때문이다(갈 2:1,3).
디도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시기는 대략 바울일행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를 펼치던 50년대 후반기로 추정된다. 교회와 선교와 관련되어
디도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때가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때이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들인 에비온파 유대인들이 침투하여 바울을 심히
비난하고 욕보이며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로부터 갈라놓을 뿐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교회들을 훼손하고 허무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태만 악화되었고, 다시 고린도 교회들의 공동 개척자였던 디모데를 보냈으나 디모데
역시 연소함 때문이었는지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도는 노련하게 고린도교회의 위기를 잘
해결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데 디도나 디모데는 지역교회를 담임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사자” 곧
바울을 대리한 준사도급 순회사역자였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는 말씀을 볼 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직접 그레데를 방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연금되었다가 풀려난 주후 63년부터 디도서가 쓰인 66년경 사이, 특히 65-66년경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는 말씀을 볼 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직접 그레데를 방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연금되었다가 풀려난 주후 63년부터 디도서가 쓰인 66년경 사이, 특히 65-66년경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레데에는 바울과 디도가 방문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를 방문했을 때는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지역들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후였기 때문이다. 그레데에도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대척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레데에서도 유대교인들의 텃세와 핍박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음으로써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이 같은 문제 곧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였다.”
장로들을 세우는 목적은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는 것이었다(행 20:28). 바울은 교회를 조직할
때 집사들보다는 장로들부터 먼저 세웠다. 집사들은 장로들을 보조하는 봉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집사들보다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새로 조직된 교회들을
위한 급선무였다. 또 사도나 준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기보다는 장로들이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었다.
1세기 교회들은 유대교 회당의 전통에 따라 세 명의 장로들을 장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교 회당에는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회당장과 지방공회원(지방재판장)을 담당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이런 유대교 전통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울이나 준사도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장로들은 개교회의 붙박이 지도자들이었고, 목양자와 감독자였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한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다.
바울이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4세기말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종교가 되면서부터 예배의식이 ‘미사’ 곧 제사예배로 급격히 발전되면서 장로들은 사제(priest)로 바꿔
계급화 되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에는 칼뱅과 녹스와 같은 이들이 평신도 장로대의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신교에서는 사제가 장로기능의 하나인
‘목양자’(pastor)로 바꿨고, 한국에서는 ‘목사’라 일컫게 되었다. 그러나 1세기 교회질서로 볼 때, 장로들이 반드시 설교자였던 것은
아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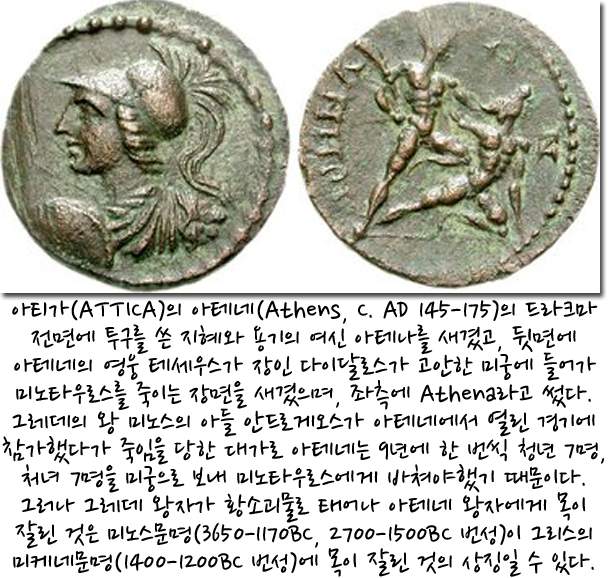 장로와 감독은 적어도 1세기 말까지는 동일한 직책이었다. 그러다가 1세기 말에 가서야
비로소 감독직을 주창한 순교자 이그나티오스가 시무한 안디옥교회와 같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담당한 장로를 일컬어
감독(주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세기말부터 사제계급화가 되기 이전인 4세기말까지 감독(주교)이란 말은 한국식의 담임목사 혹은
미국식의 인도목회자(Lead Minister) 개념에 해당되었다. ‘Lead Minister’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는 ‘Senior
Minister’라 불렸다. 그러므로 60년대에 기록된 디도서에 언급된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책 곧 목양의 기능과 감독의 기능을 함께 가진
목회자를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감독으로 세울 자에 관해서 6-9절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장로와 감독은 적어도 1세기 말까지는 동일한 직책이었다. 그러다가 1세기 말에 가서야
비로소 감독직을 주창한 순교자 이그나티오스가 시무한 안디옥교회와 같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담당한 장로를 일컬어
감독(주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세기말부터 사제계급화가 되기 이전인 4세기말까지 감독(주교)이란 말은 한국식의 담임목사 혹은
미국식의 인도목회자(Lead Minister) 개념에 해당되었다. ‘Lead Minister’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는 ‘Senior
Minister’라 불렸다. 그러므로 60년대에 기록된 디도서에 언급된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책 곧 목양의 기능과 감독의 기능을 함께 가진
목회자를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감독으로 세울 자에 관해서 6-9절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장로가 도덕과 윤리에서, 인격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란 일부일처
곧 한 명의 아내만을 둔 남편을 말한다. 그리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장로는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7-8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한다.”는
말씀 그대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장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16세기 이후 개신교회들에서는 치리 장로들과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말씀선포와 목회에 주력하는 목사들로 나뉘어져 있고, 목사도 장로인가라는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목사를 Pastor라 부르는
전통들에서는 대체로 장로로 보는 입장이고, Minister라 부르는 전통들에서는 대체로 장로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믿고 신뢰할만한 표준이란 뜻이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가르침 곧 신약성경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뜻이다.